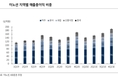[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산하에 우주 상황을 감시할 전담부대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간의 관심이 그 이유에 쏠리고 있다. 공상과학영화(SF)에 나오는 외계의 생명체가 쳐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위성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위성은 오는 2022년 가동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우주 관련 경비 887억 엔(약 8607억원)을 반영함으로써 그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1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방위성이 우주감시 부대를 창설키로 한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외계 생명체의 침입보다도 현실적으로 더 무서운 우주를 떠도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에 있다.
우주 쓰레기 대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하시모토 야스아키(橋本靖明) 방위연구소 정책연구부장은 NHK에 우주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에서 관측이 가능한 사방 10㎝ 이상 크기의 우주 쓰레기만도 2만개 이상이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위성은 관측 등에 편리한 것으로 알려진 고도 1000㎞ 이하의 ‘저궤도’와 고도 3만6000㎞의 ‘정지궤도’에 집중돼 있고 쓰레기도 이 궤도 위를 떠돌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시모토 부장은 이들 쓰레기는 가동 중인 인공위성에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될까라는 의문에 “유리 파편이 잔뜩 널려있는 긴자(銀座)대로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위성은 인력에 지지 않기 위해 초속 7㎞의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데 이는 사방 10㎝ 크기의 파편과 충돌하면 인공위성이 치명적으로 파괴될 만큼 빠른 속도”라면서 “수십억 엔, 수백억 엔을 들인 인공위성이 ‘쓰레기’ 하나 때문에 수명을 마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인공위성을 직접 위협하는 ‘대(對)위성 무기’가 될 위험성이 그것이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은 2007년 노후화한 자국 인공위성을 지상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파괴하는 실험을 실시했는데 이 바람에 대략 3000개의 우주 쓰레기가 궤도에 흩어졌다.
하시모토 부장은 이들 우주 쓰레기와 위험에 대한 대처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에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이 우주 쓰레기 제거기술을 연구 중이지만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우주 쓰레기를 피하고, 대위성무기로부터 도망치는 일 밖에 할 수 없는 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주공간을 상시 감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주를 감시할 레이더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44억엔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11월 21일 레이더 기지 건설예정지인 야마구치(山口) 현 산요오노다(山陽小野田)시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한편 지금부터 60년 전인 1957년 옛 소련이 인류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린 이래 세계 각국은 기상관측위성과 정보수집, 통신, 방송위성 등을 경쟁적으로 쏘아 올리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각국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은 올 2월 현재 7600개가 넘는다. 이중 회수했거나 고도가 떨어져 낙하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도 4400기 이상의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다. 이중 사용이 끝난 위성이나 발사 시의 로켓 부품, 망가진 연료탱크 파편 등이 마찬가지로 궤도 위를 돌기 시작해 ‘우주 쓰레기’가 되고 있다.